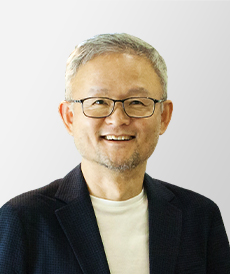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실패하다. 30년간 방치된 폐공장 부지에 건설된 혁신신산업단지가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경제 정책의 오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지 두려운 원도심,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든다. 이는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패를 넘어, 생태계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연결고리를 간과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기사 전체 내용을 5W1H에 입각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누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과 같은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간과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 **무엇이:**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설계와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실패를 겪게 된다.
* **어떻게:**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결정이 생태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제대로 궤를 갖지 못하게 된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 역시 생태계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멈춰버린다.
* **언제:** 1992년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민주당 대선후보 빌 클린턴의 선거캠프에서 ‘경제야, 바보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의 상황을 비교하며 분석한다.
* **어디서:** 30년 동안 방치된 제강공장 부지, 그리고 신규 혁신도시 개발 지역 –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한다.
* **왜:** 경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결정이 생태계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먼저, ‘종 다양성’이 생태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종이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며, 먹이사슬로 얽히고, 수정을 도와주고, 분해와 재생산을 담당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종 다양성이 깨진 생태계의 괴멸적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단일 품종의 감자에 의존하던 아일랜드에 감자역병이 돌자,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는 경제적 성장을 위해 생물 다양성을 무시한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설명한다. 태양에너지는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진다. 이런 순환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나무가 쓰러지면 곰팡이와 버섯이 큰 조각들을 분해하고, 세균이 그 조각들을 더 잘게 나눠 토양으로 되돌린다. 순환해야 생태계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친교배 우울증’ 또는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가문 내에서 짝짓기가 거듭 되풀이될 때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TSMC의 기술 경쟁력에 뒤처진 이유를 설명한다. 10배 작거나, 10년 뒤처진 패키징 기술은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결과다. 파운드리 경쟁이 진작에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것을 삼성전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경제 정책이 단순히 ‘성장’만을 목표로 할 때, 생태계와의 관계를 간과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외침은 이러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