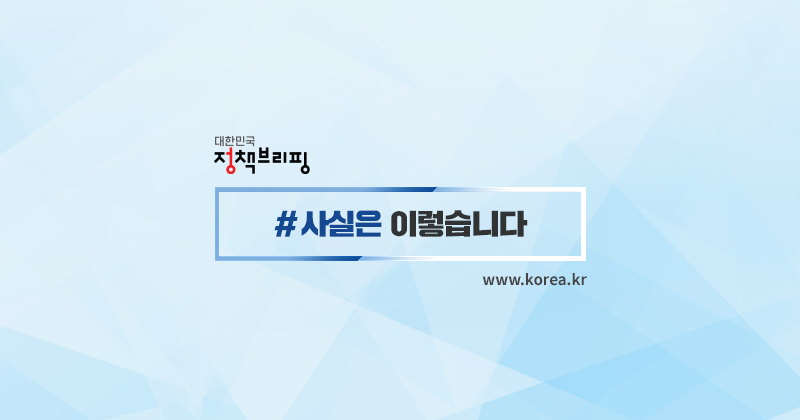
최근 일부 보도에서 국가채무 산정 시 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을 대응 자산으로 보거나, 대응 자산이 부족함에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여 정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실제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모든 금전 채무를 포괄하며, 여기에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채무 관리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담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의 규모와 증가 속도를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참고 지표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채무 유형이 회계나 기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금융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일 뿐, 해당 금융 자산이 나랏빚 상환의 직접적인 재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주택 청약저축이나 외환보유액을 직접적으로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국가채무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의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정보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