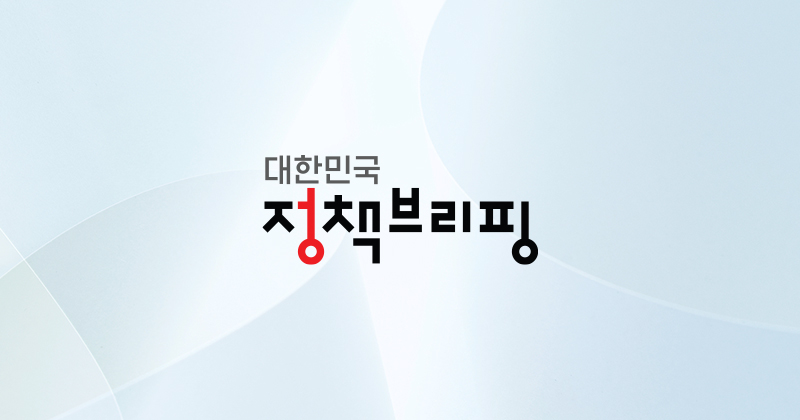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1996년을 정점으로 혼인 건수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고, 2023년에는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 이전까지의 하락 폭은 매우 컸다. 평균 초혼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에 달했다. 이는 199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5세, 6.2세나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전반적인 혼인율 하락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혼인율 하락과 함께 출생아 수 역시 급감했다. 1995년 71만 5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떨어졌으며, 2024년에는 23만 8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30대 및 4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첫째아 출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덜 낳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높은 주거 비용, 불안정한 고용 환경,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초혼 연령 상승과 출생아 수 감소는 미래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