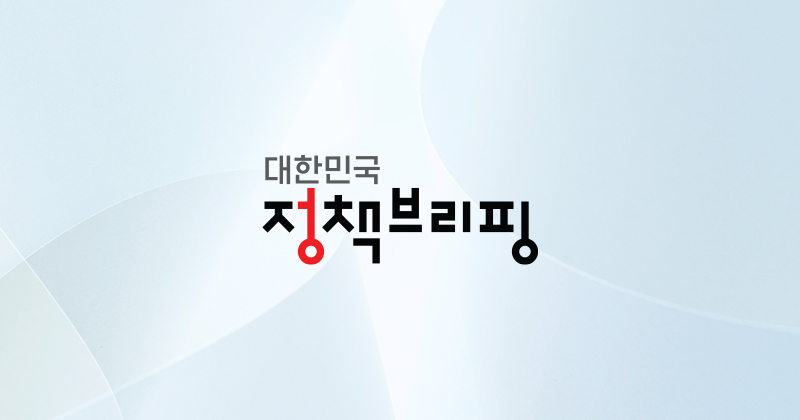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생 관련 지표는 심각한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며,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96년을 정점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결혼 연령의 상승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기준으로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에 이르렀다. 이는 1995년 대비 각각 5.5세와 6.2세나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과의 혼인 역시 2005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혼인 추세의 변화는 곧바로 출생아 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5년 71만 5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 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5년 대비 약 67.8% 감소한 수치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24년에는 23만 8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그동안의 급격한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출산율 추세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30대 및 4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첫째 아이 출산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혼인 및 출생 지표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한다. 과거의 가파른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로 전환된 2023년과 2024년의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30대 및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증가와 첫째아 출산 비중 증가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