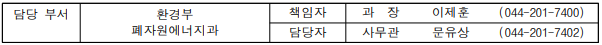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지만,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처리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자칫 ‘폐기물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소각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 및 잔재물만이 매립 가능해진다. 이미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각 지역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2027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시점인 2026년 1월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9월 2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이룸센터에서 만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폐기물 처리 대책의 미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현재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계획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직매립 금지 제도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3개 시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을지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