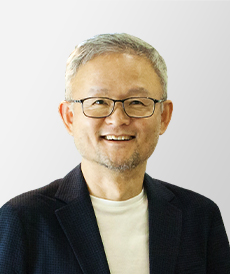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데이터’ 구축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많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로그’란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해일지인 ‘로그북’에서 유래한 이 시스템은 로그인, 파일 삭제, 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 로그’, 특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 로그’, 사용자 로그인 실패나 권한 변경과 같은 보안 관련 사건을 기록하는 ‘보안 로그’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로그 기록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많은 공공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로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이용자가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이 발생하는지, 혹은 서비스 로딩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뉴 배치 최적화나 서비스 속도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 작업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발전한다. AI 전환의 성공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가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AI 비서가 이용자의 업무를 돕고,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 시너지를 제안하며, 회의록을 바탕으로 할 일과 책임자, 일정 등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모두 방대한 데이터 축적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AI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AI 솔루션 도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며, 더 스마트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로그가 없는 웹페이지를 일만 년을 운영한들, 그 서비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을 할수록 저절로 데이터가 쌓이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AI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축적 시스템인 ‘로그’ 구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