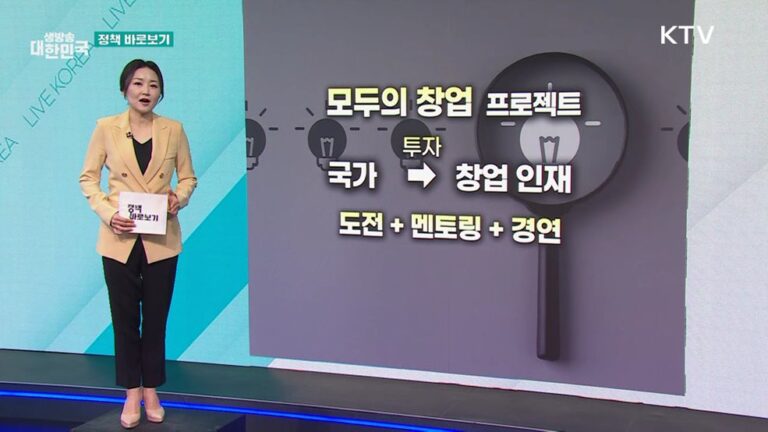'유령 경기장' 없는 올림픽, 밀라노-코르티나 분산 개최가 답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도시는 막대한 빚과 유령처럼 버려진 경기장에 신음한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설 사후 관리 문제는 개최 도시의 고질병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분산 개최’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400km 떨어진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이름을 함께 내걸었다. 개최지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곳의 클러스터로 나뉘고 선수촌도 여섯 곳에 분산 운영된다. 이는 특정 도시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기존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개회식이 열린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철거되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와 전통 설원의 코르티나담페초가 ‘조화(Armonia)’라는 주제 아래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회를 운영한다.
이러한 분산 모델은 막대한 신규 경기장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대회 후 시설이 방치되는 ‘백색 코끼리’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각 지역은 보유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올림픽을 치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파괴를 막는다. 한국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첫 메달을 획득한 리비뇨 스노파크 역시 기존의 동계 스포츠 명소다.
이 모델은 향후 올림픽 개최의 표준이 될 것이다. 단일 도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더 많은 도시와 국가가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경기장 신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올림픽 유산이 특정 도시에 짐이 되는 대신, 여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자산으로 전환된다.